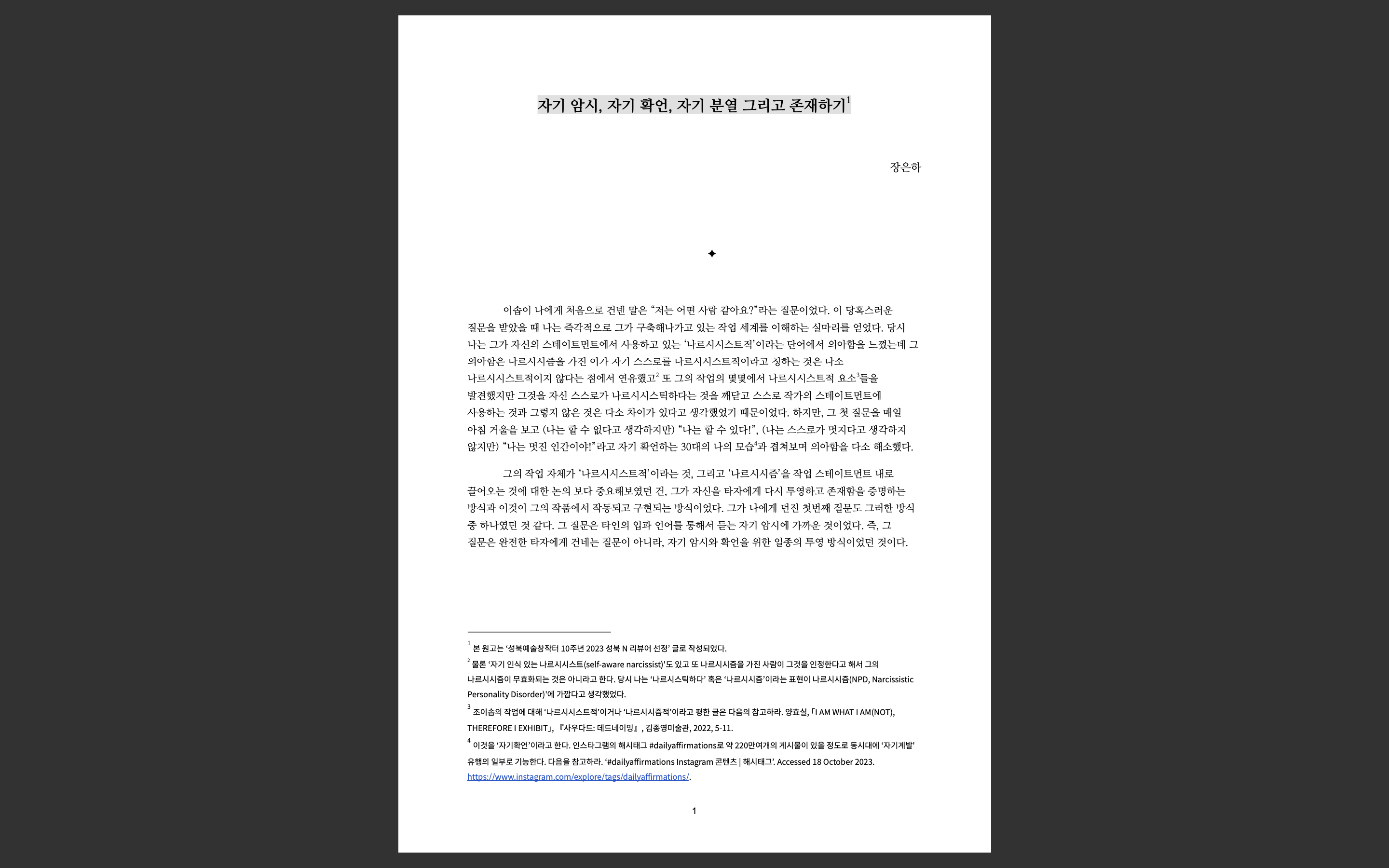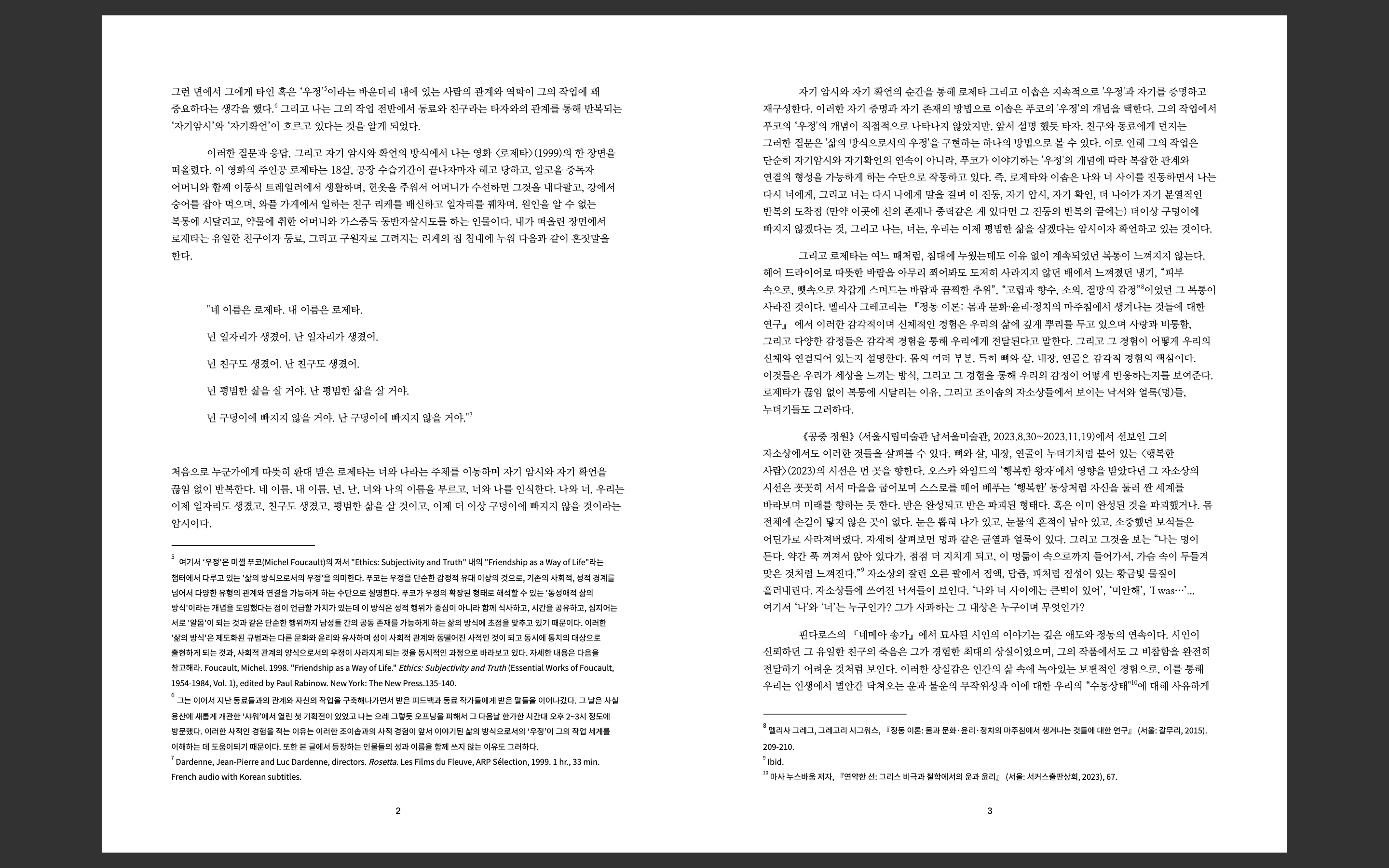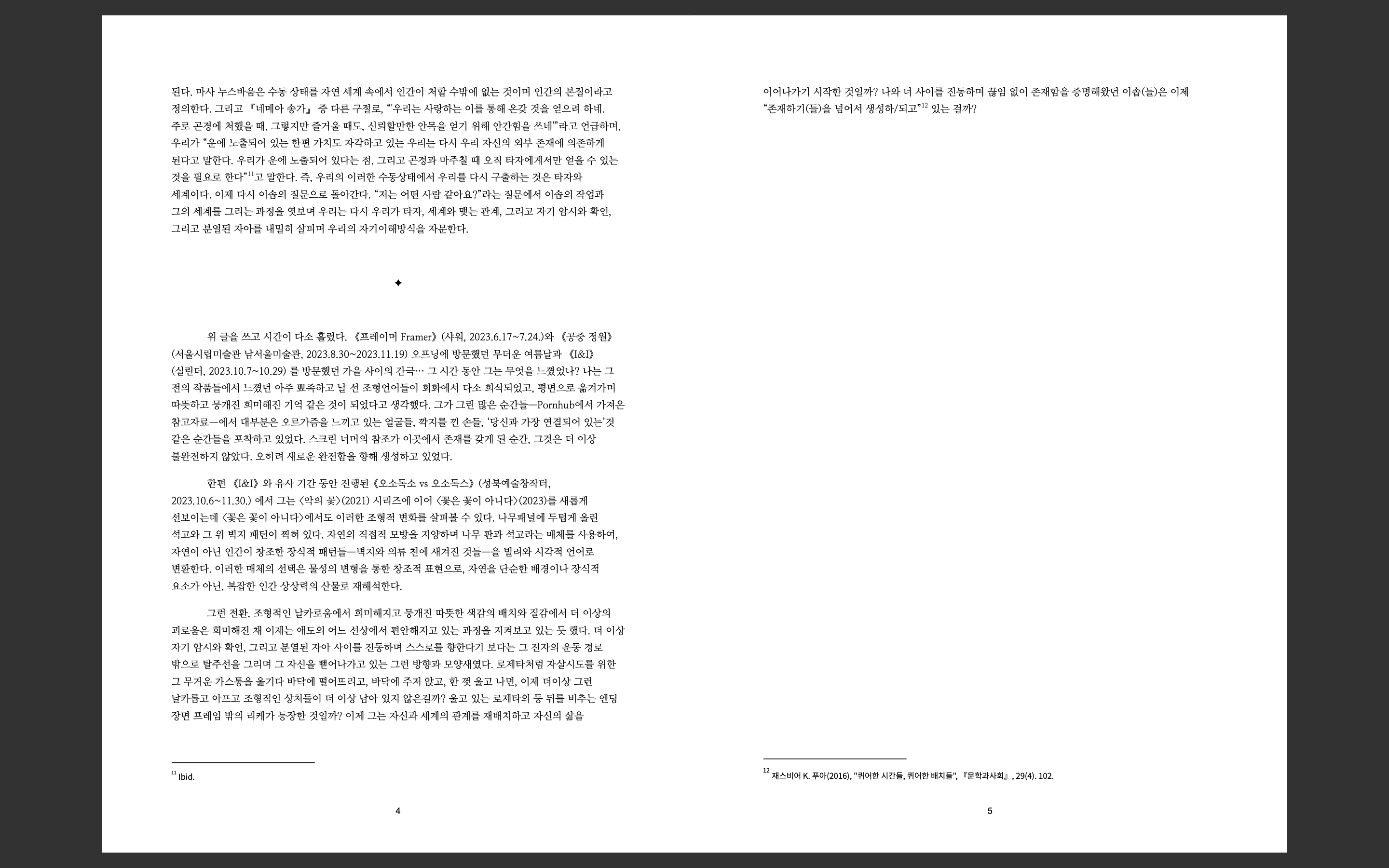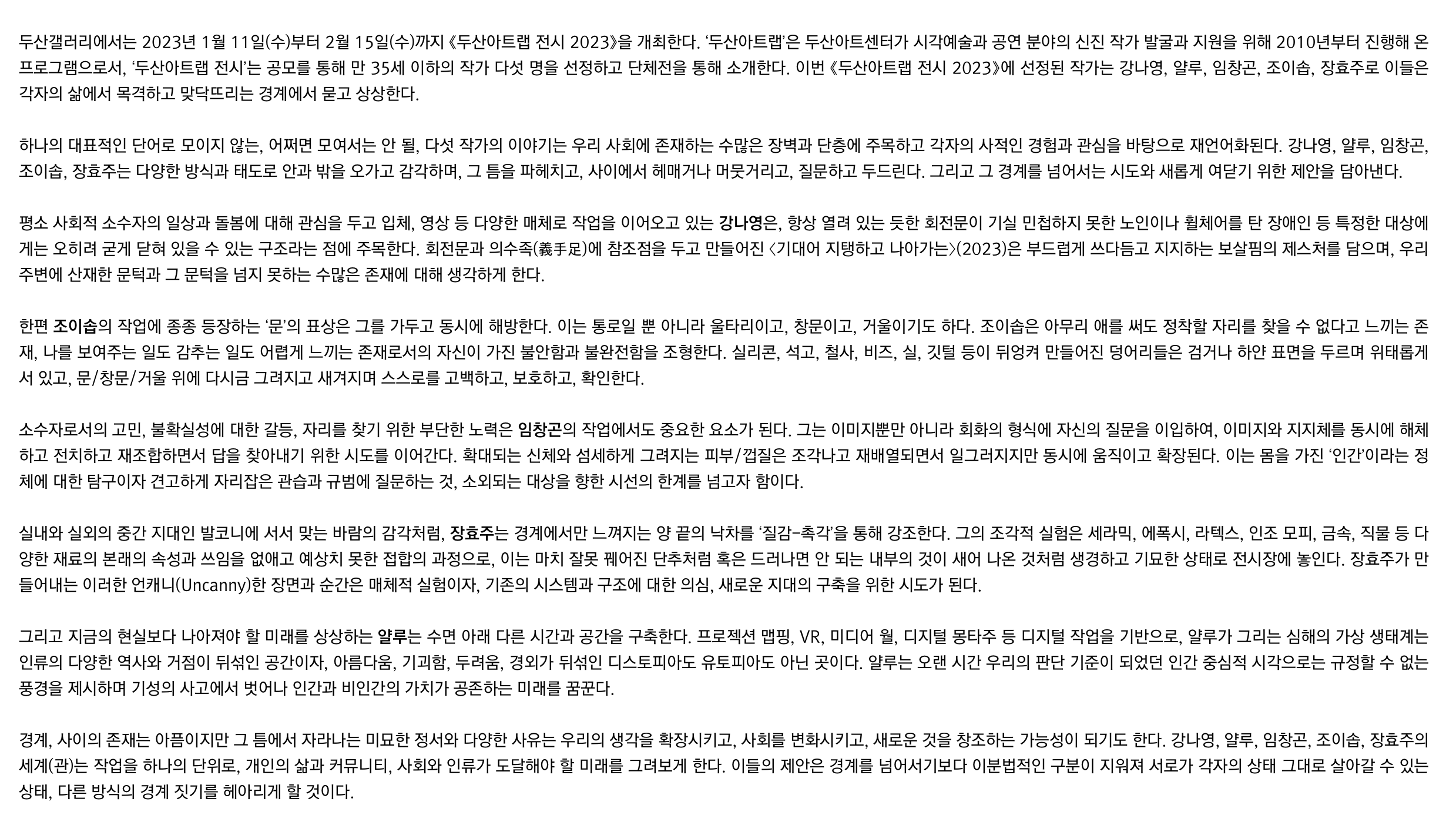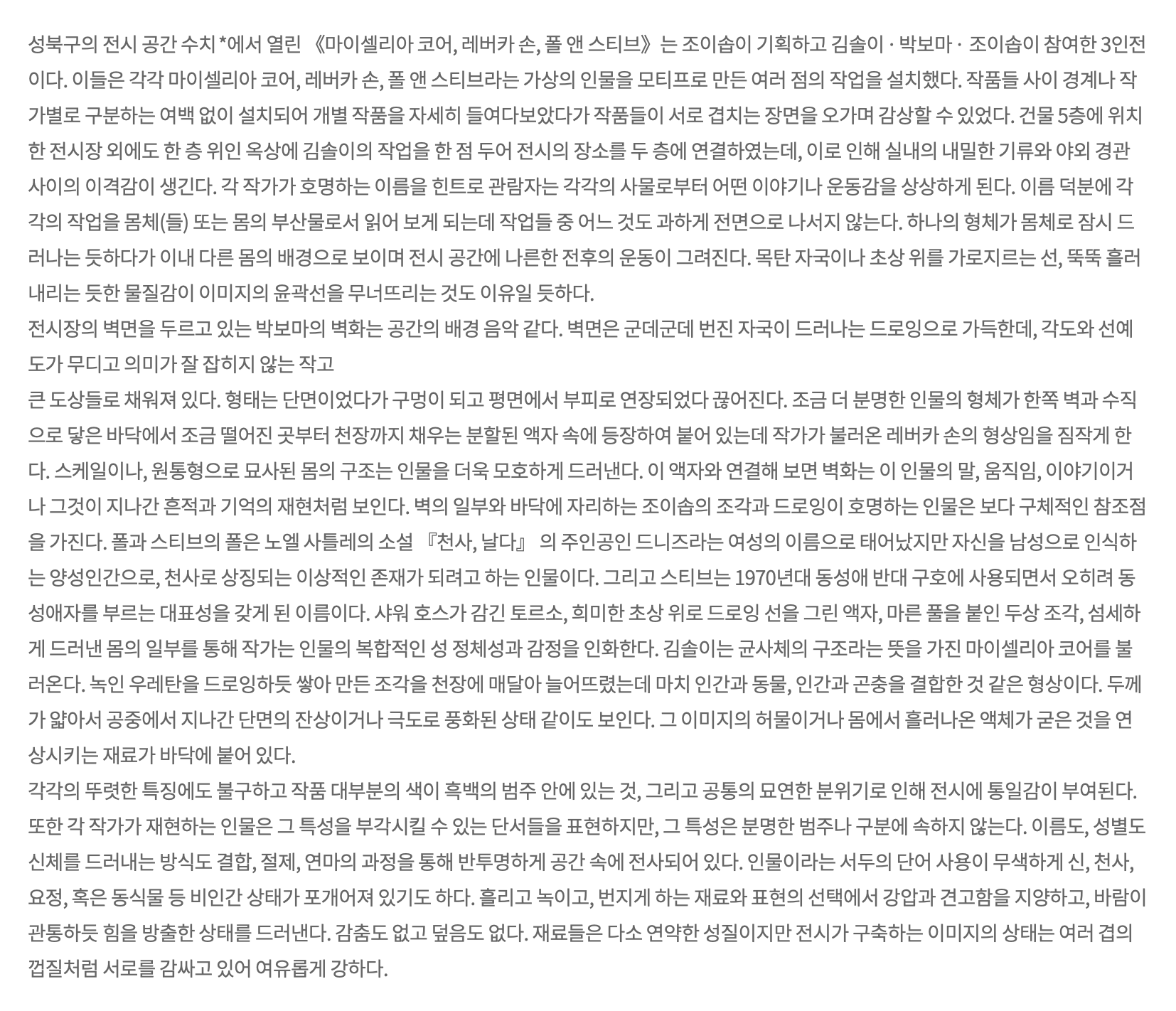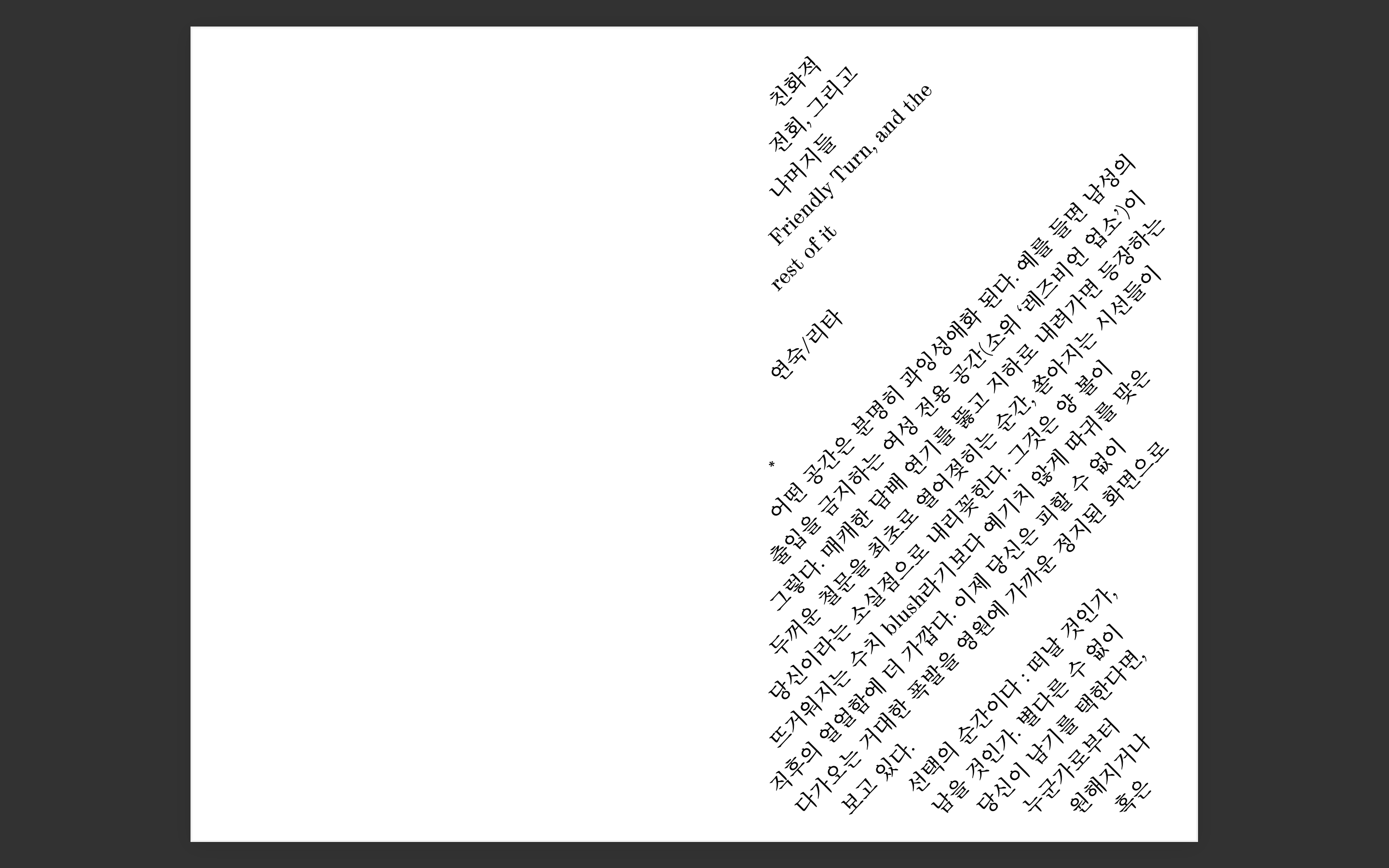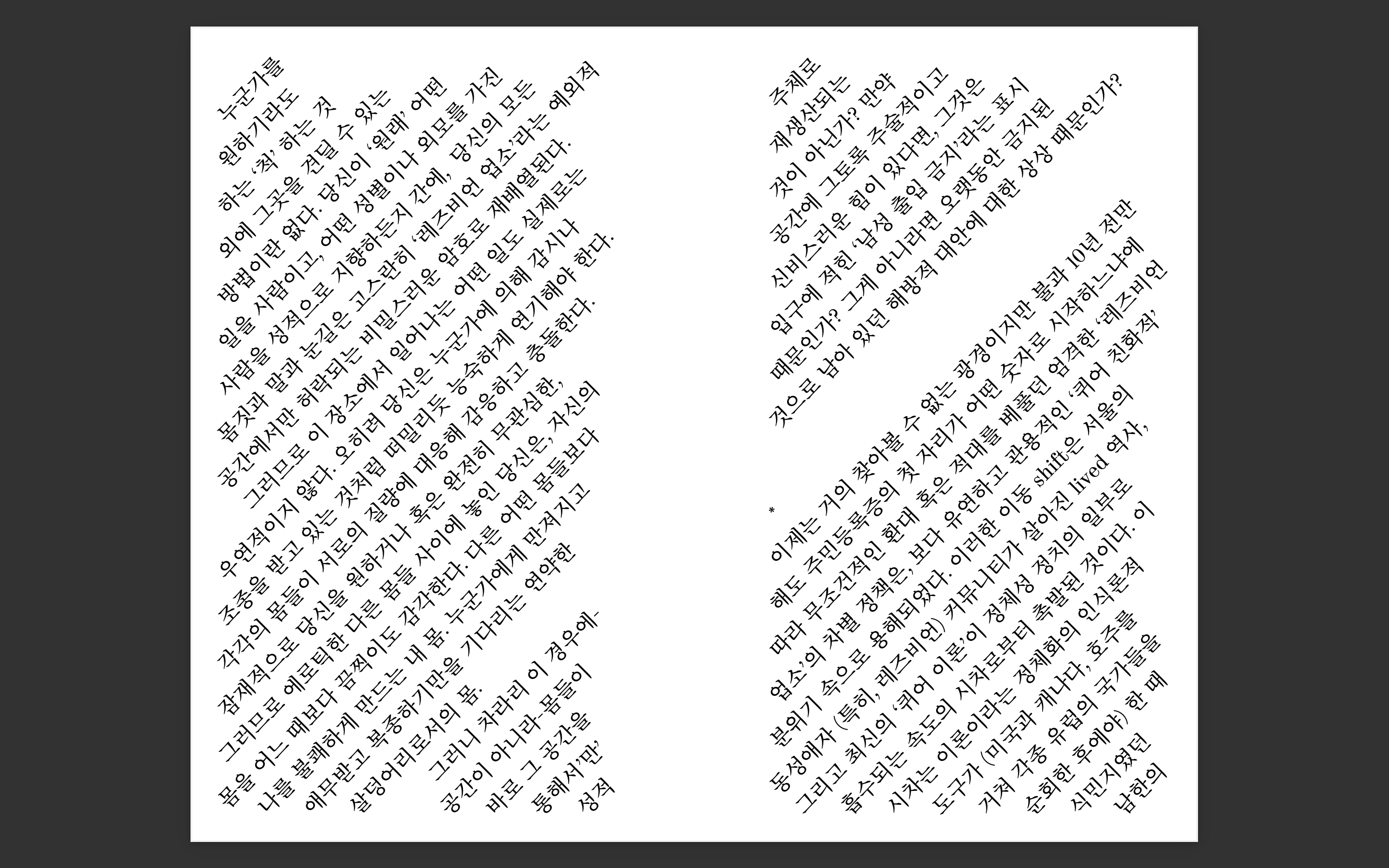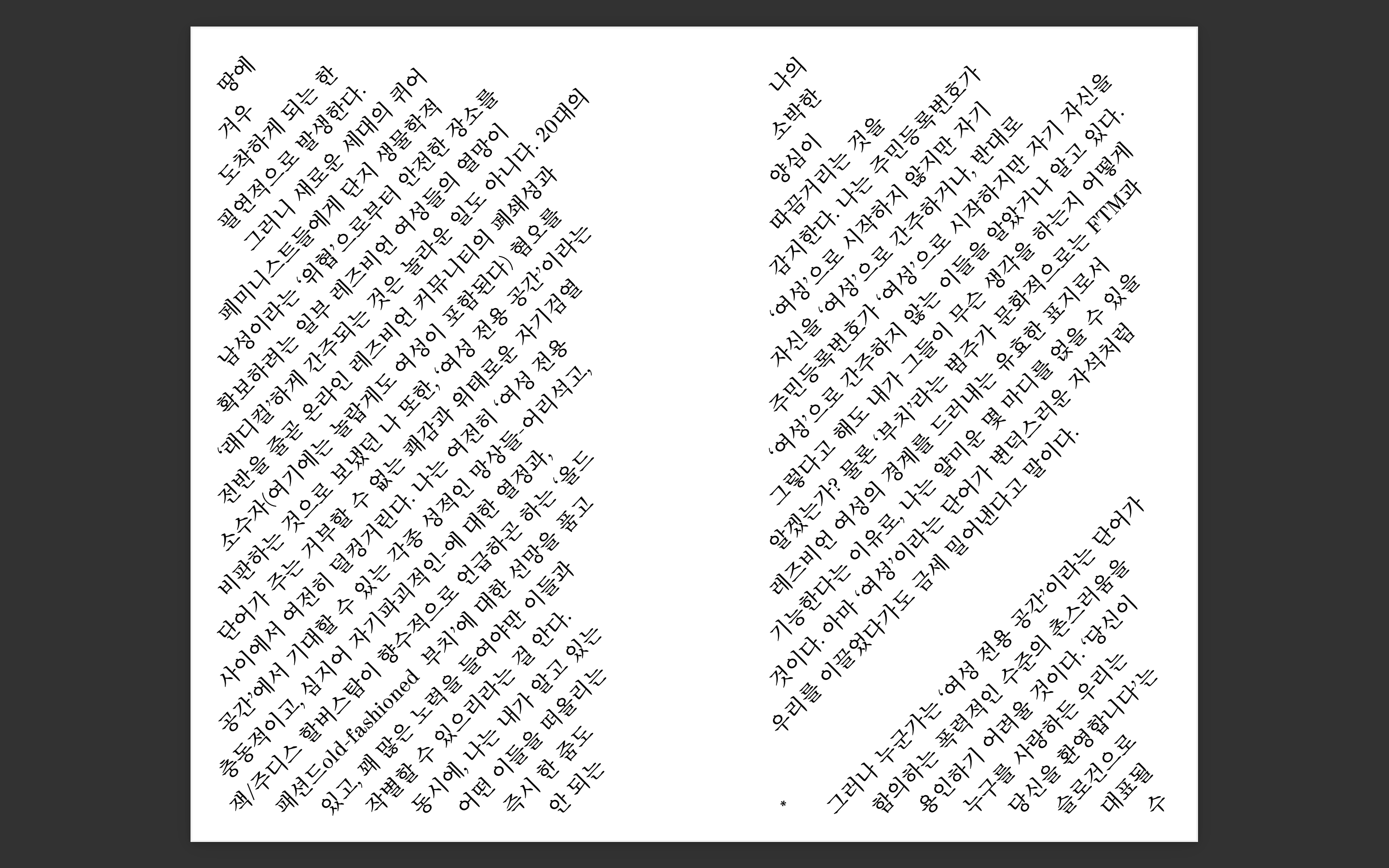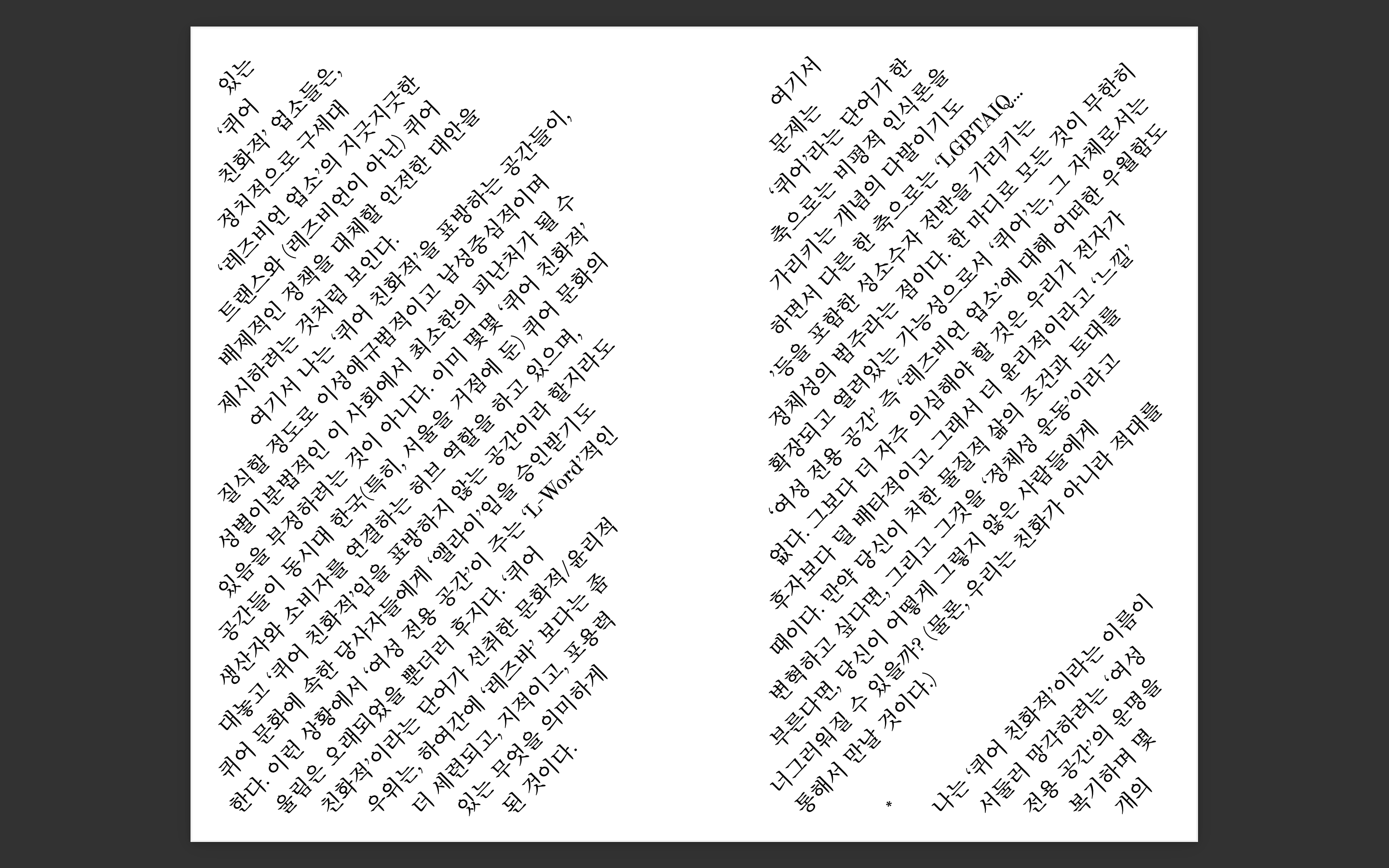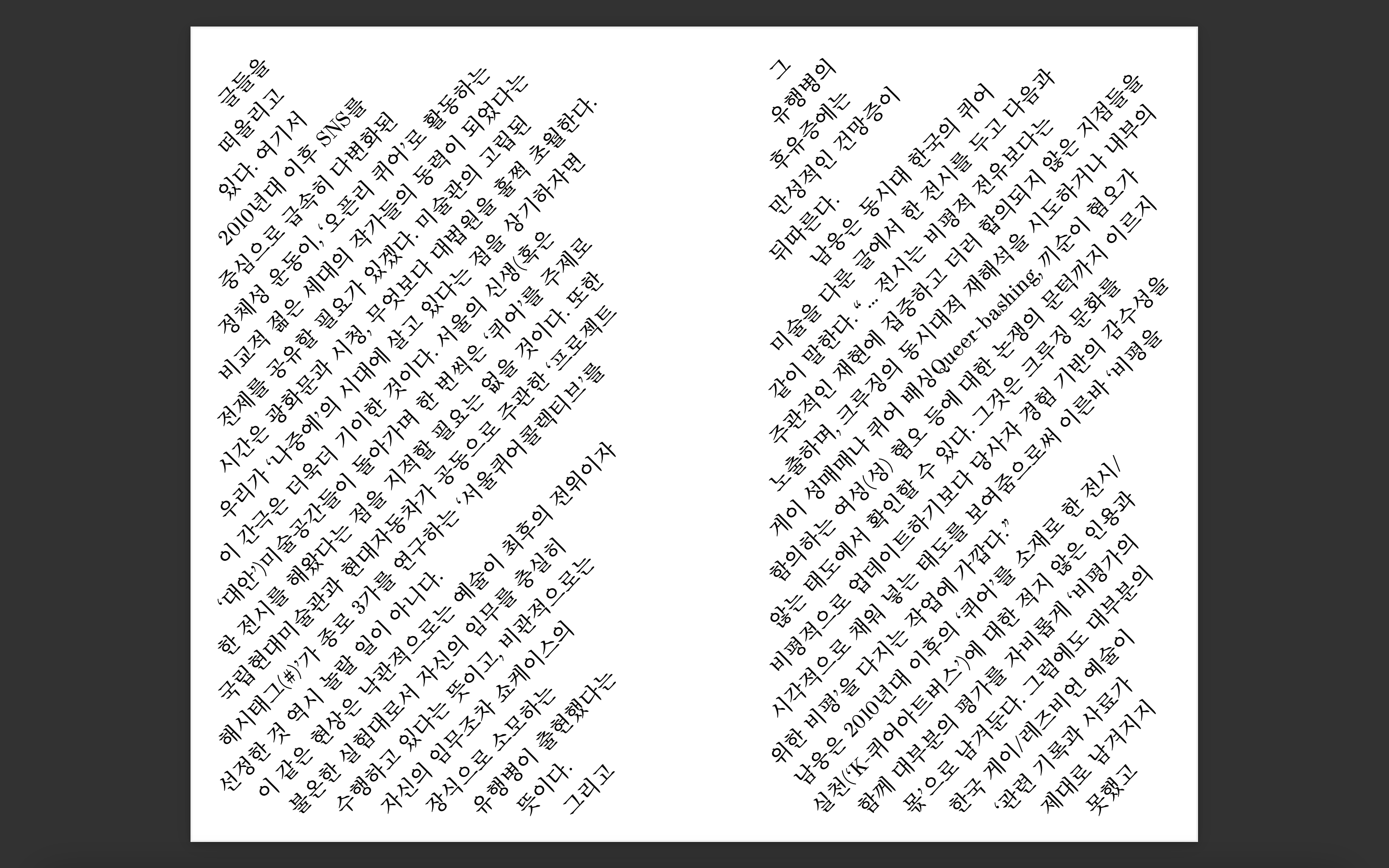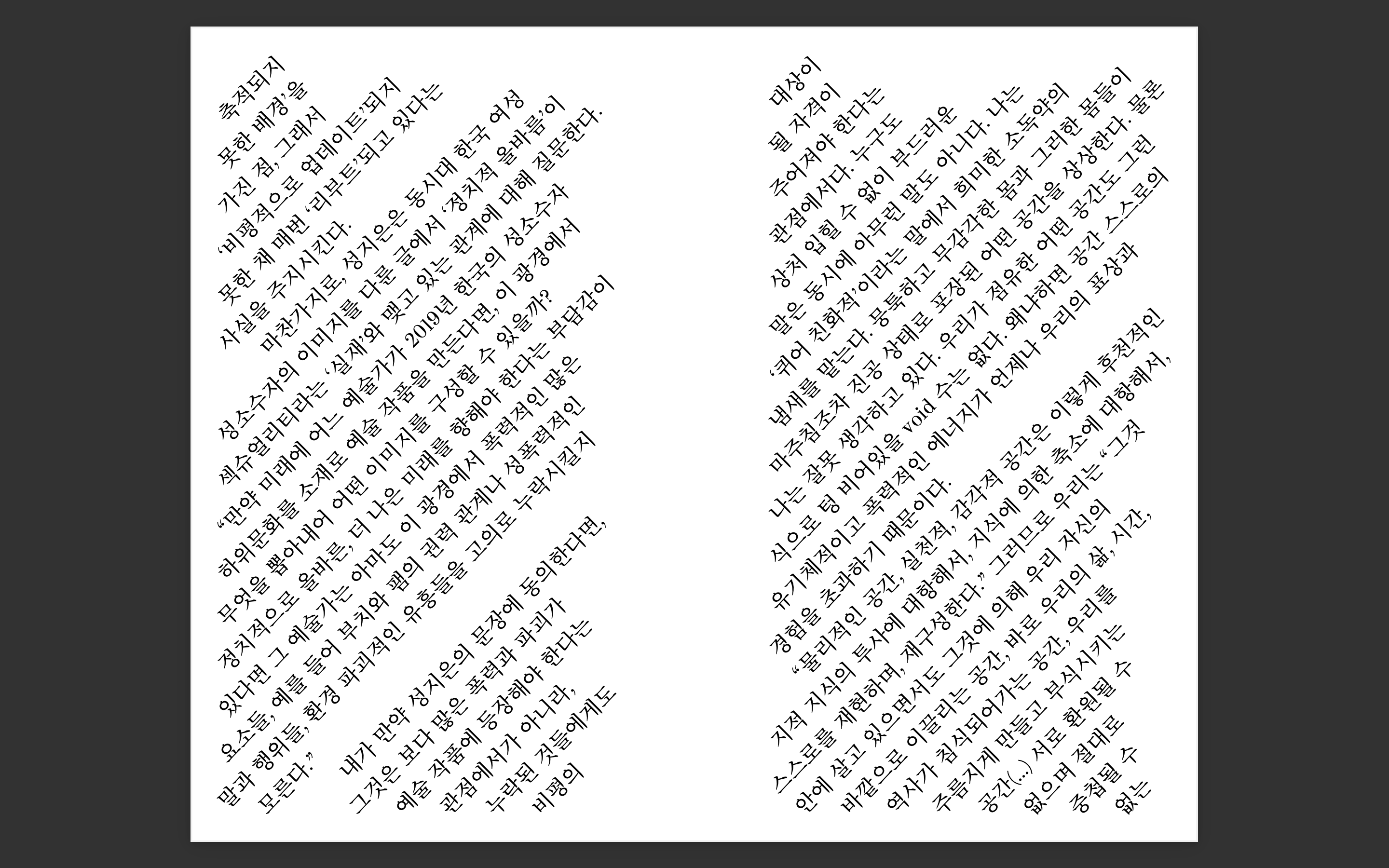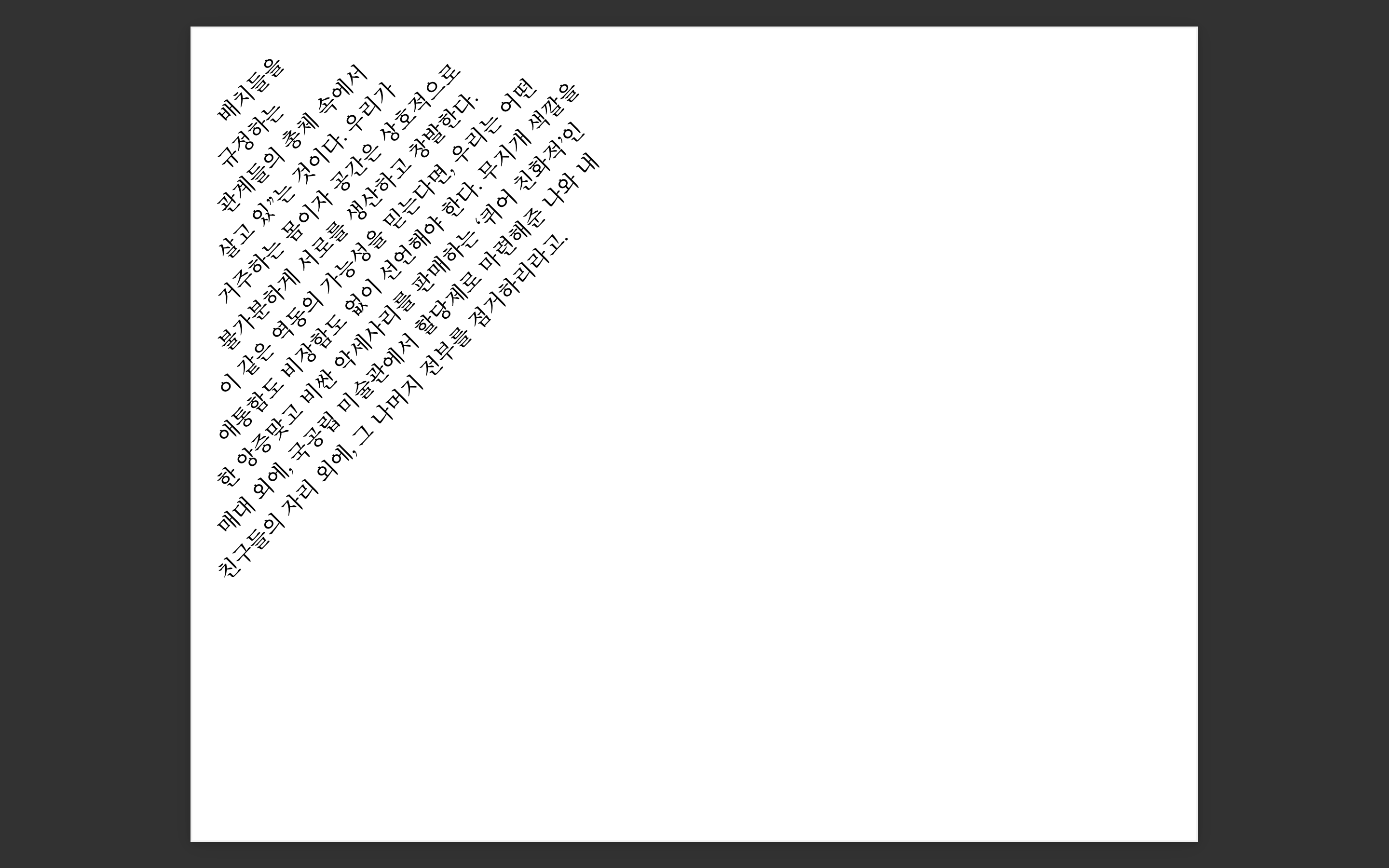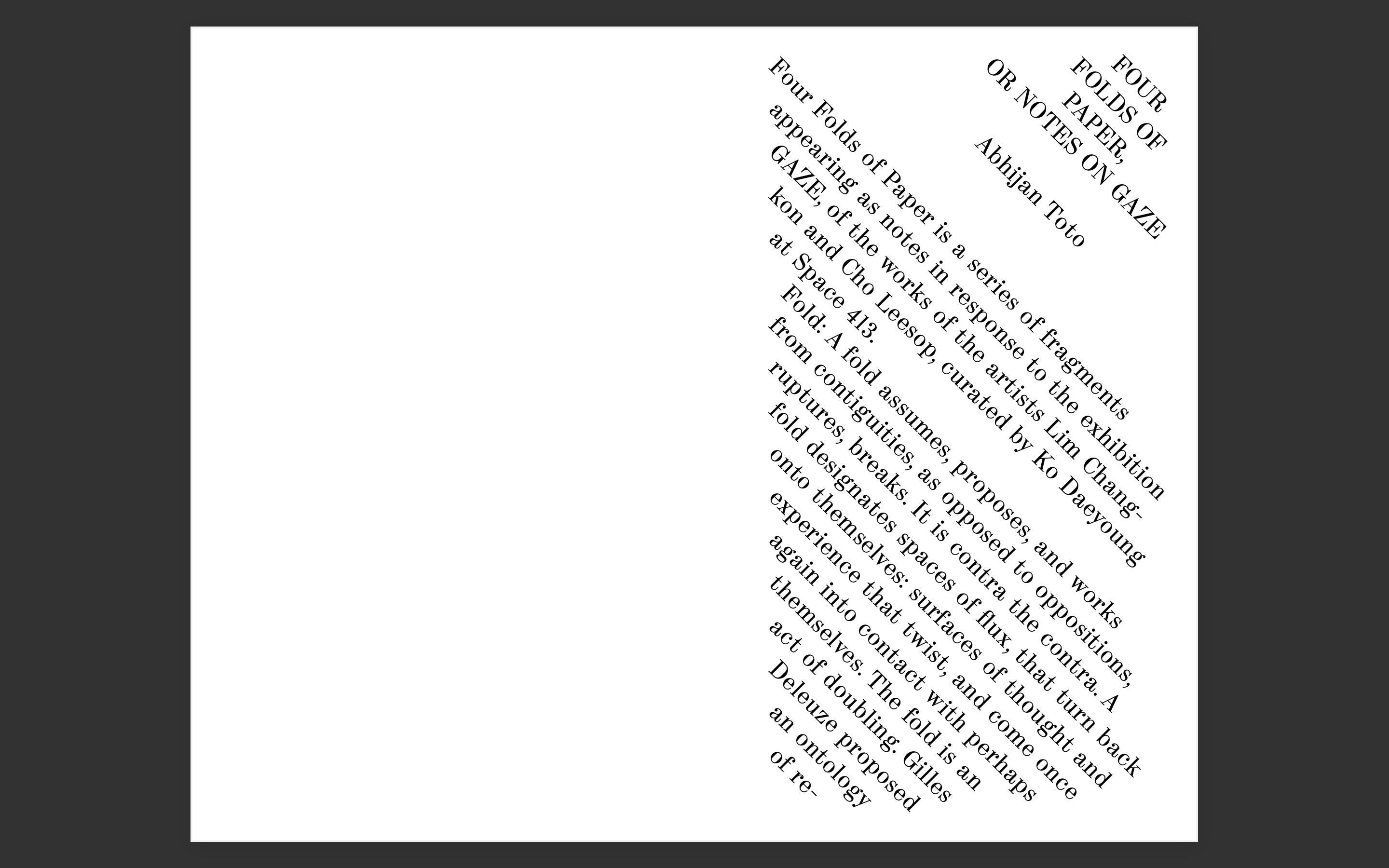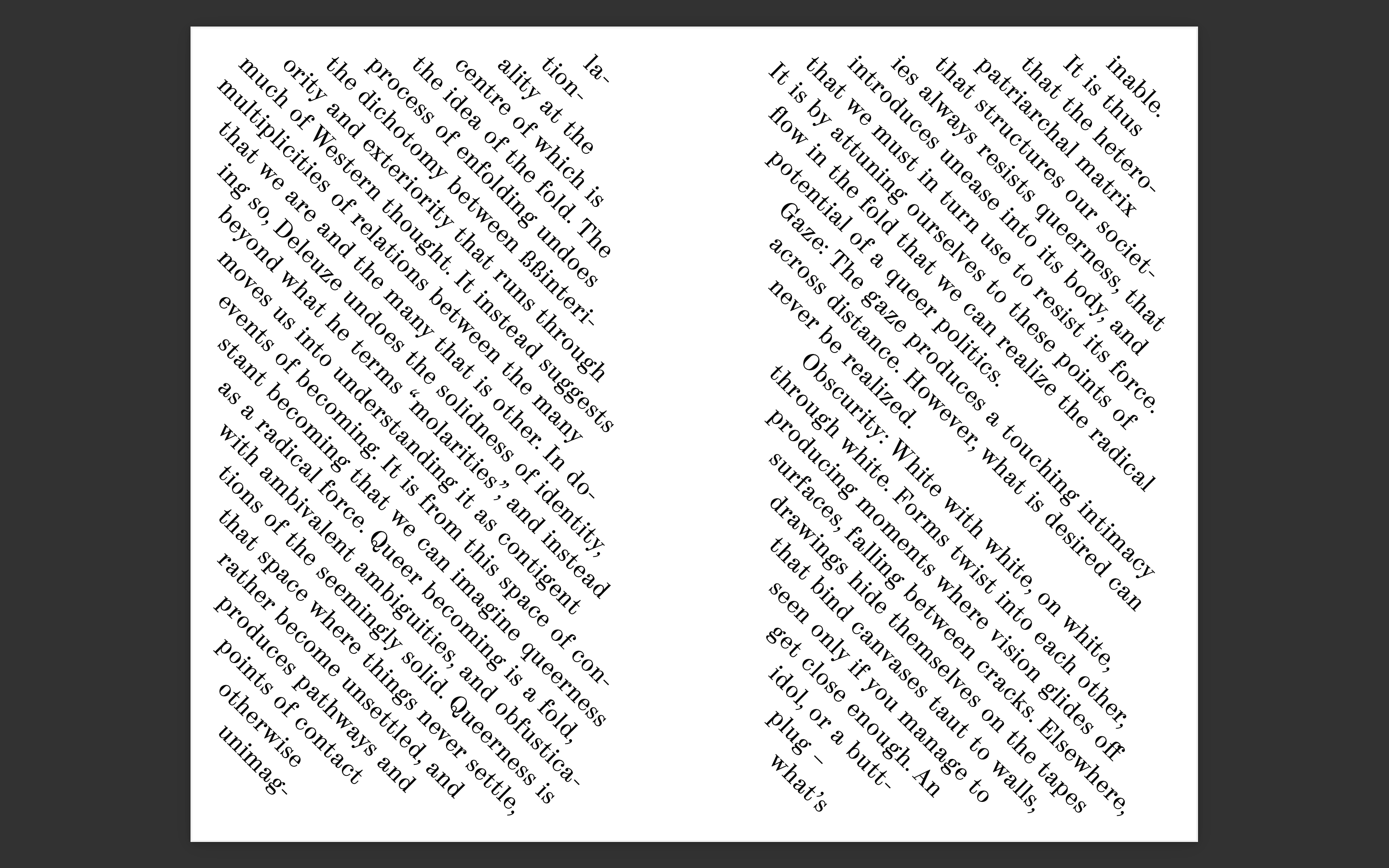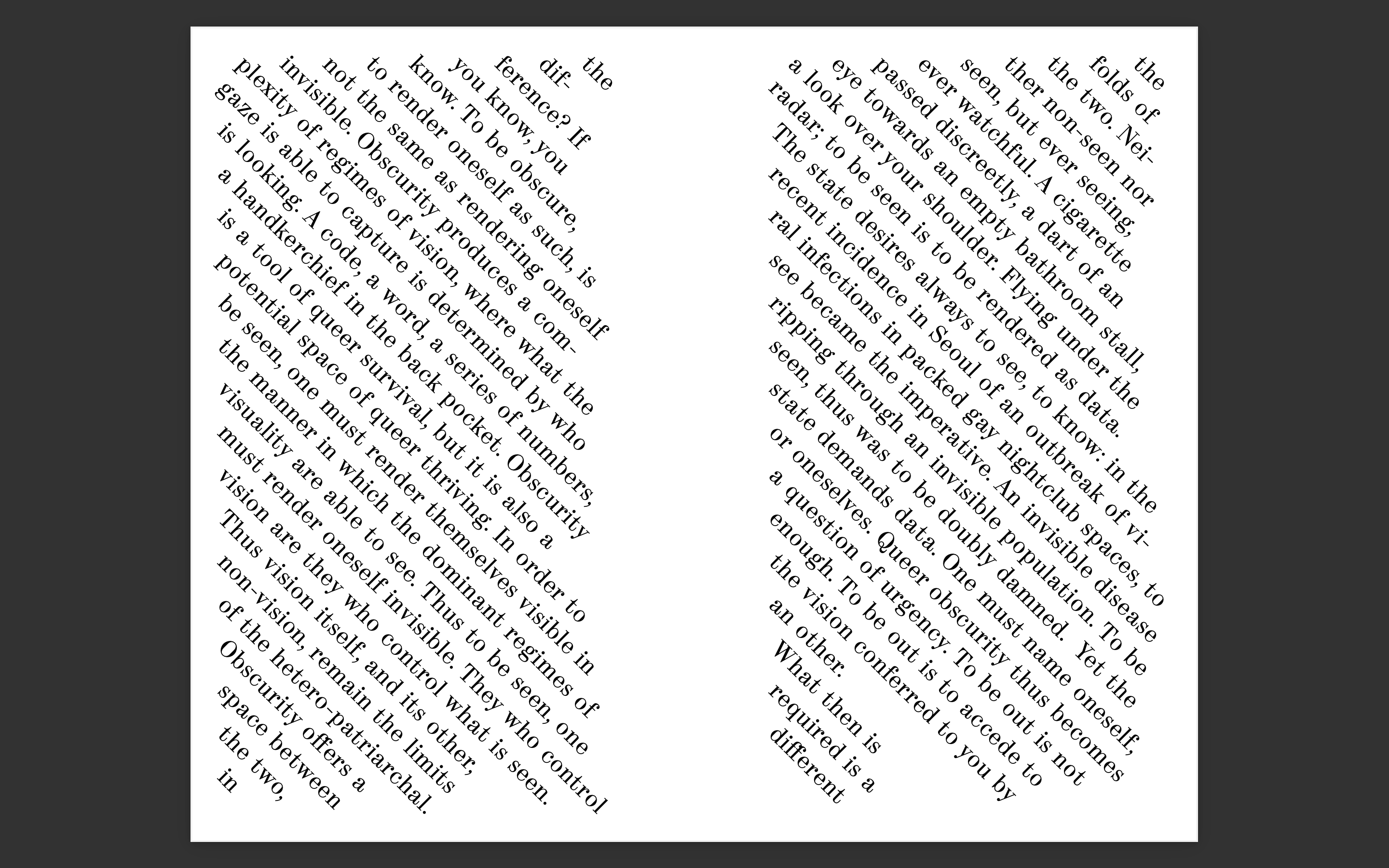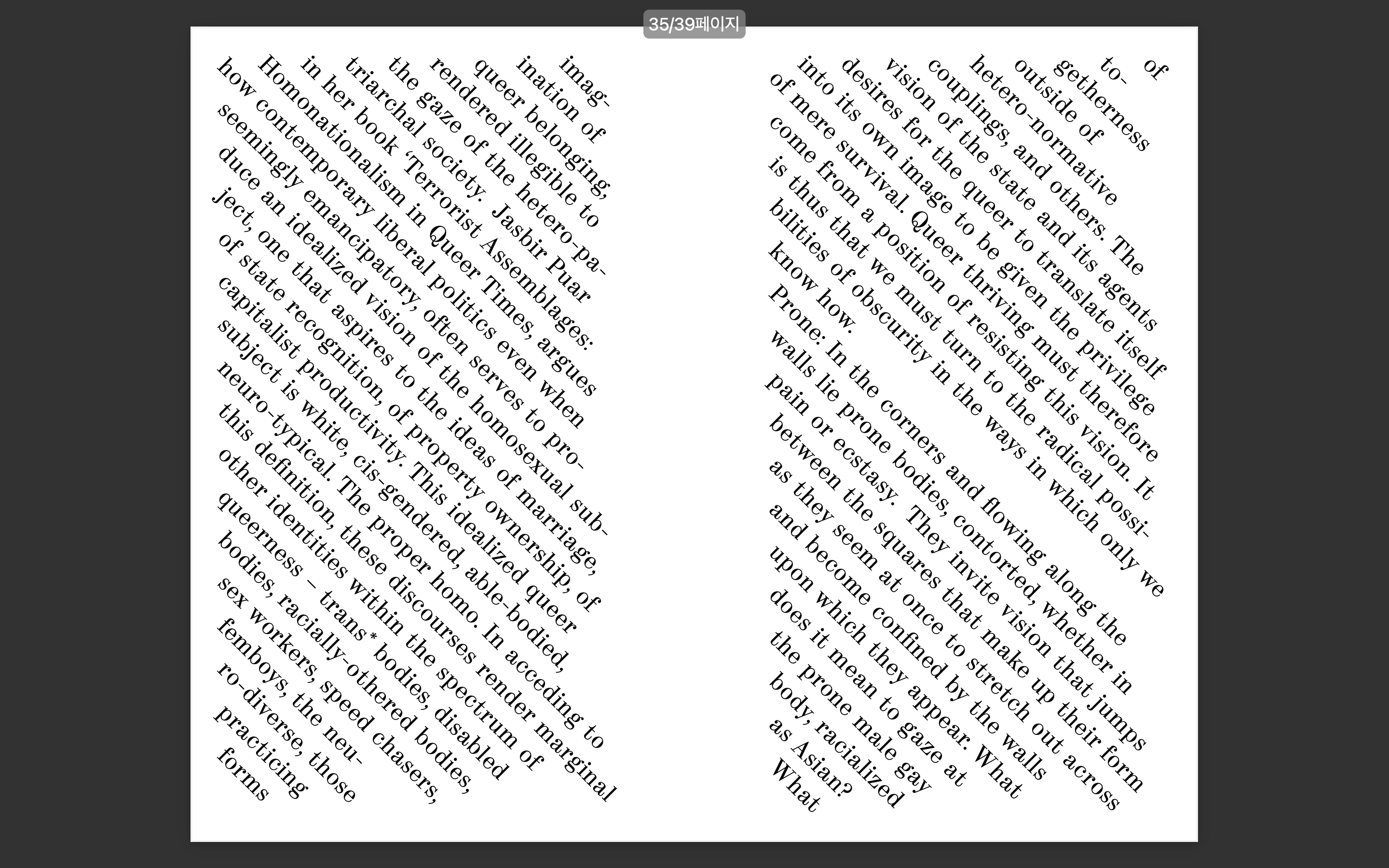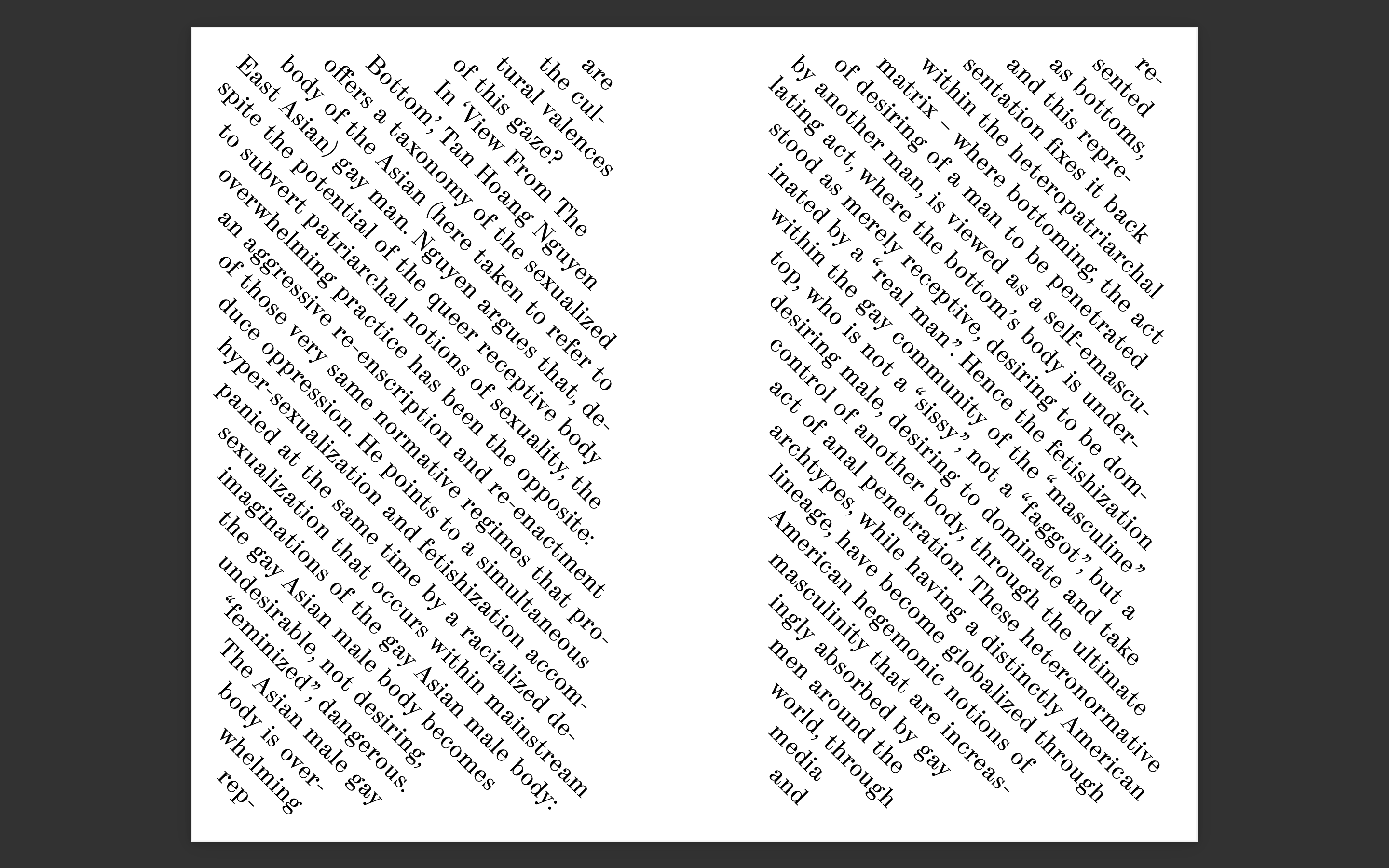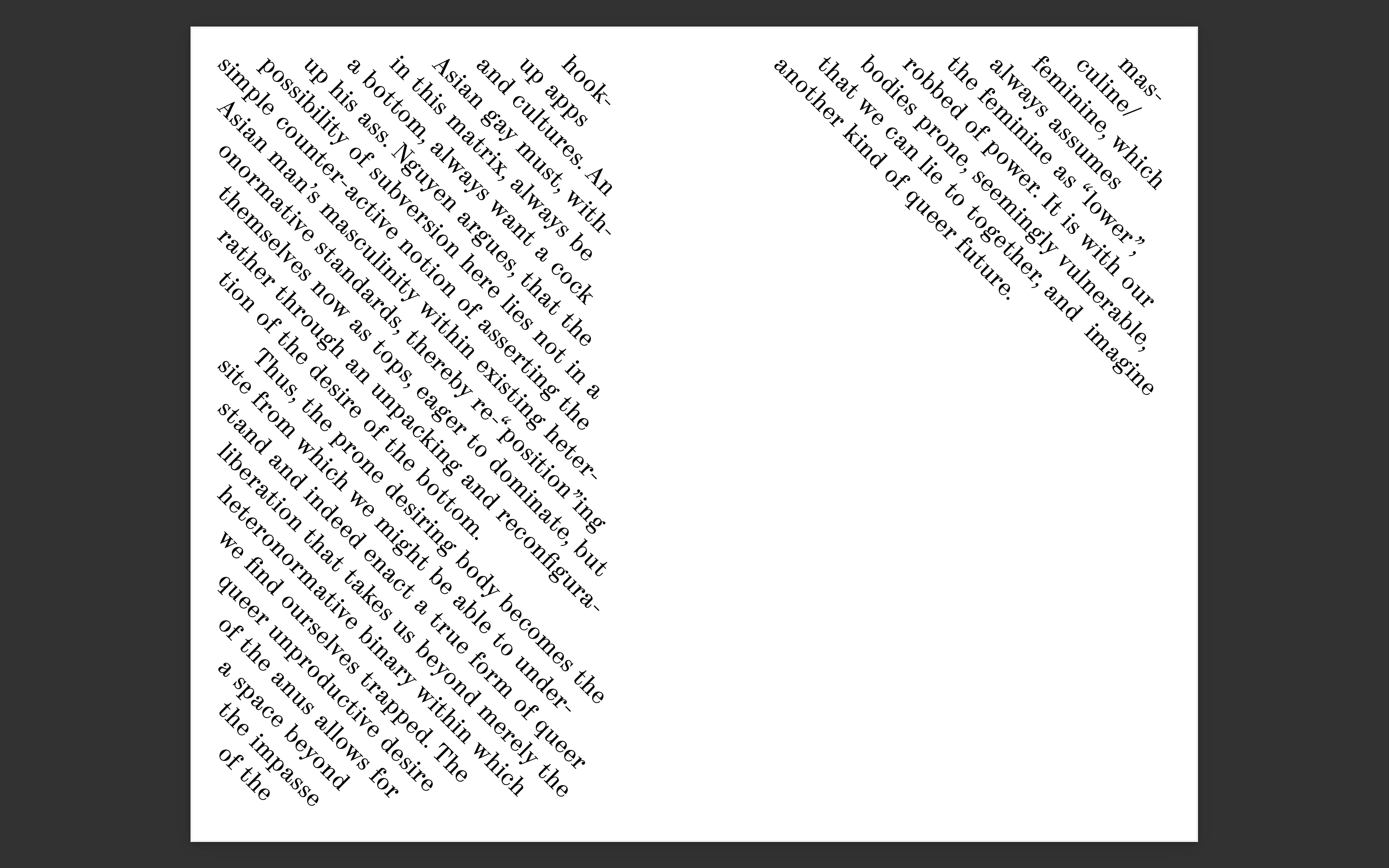______
장은하, <자기 암시, 자기 확언, 자기 분열 그리고 존재하기> (2024)
https://brunch.co.kr/@804c4fb59c8d4bb/27
![]()
![]()
![]()
______
권시우, (개인전 I&I)서문, <다크룸으로의 초대> (번역 류다연) (2023)
![]()
![]()
![]()
![]()
______
이연숙, <진격하는 저급들> 1장: 슬픈 퀴어 초상 ㅡ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 (2023)
http://semacoral.org/features/yeonsooklee-advancing-of-low-1-sad-queer-portrait
![]()
______
두산갤러리, 두산아트랩 2023 서문
https://www.doosanartcenter.com/ko/exhibit/1551?q.displayStatus=CLOSED
![]()
_______
양효실, 조이솝 개인전 SAUDADE: Dead Naming 비평 (번역 김실비) (2022)
https://adocs.co/books/saudade-dead-naming/
Below is the full text of art criticism in the book of SAUDADE: Dead Naming by Hyosil Yang. translated by Sylbee Kim. designed by Moonsick Gang.
And the poem at the end of the text is something I wrote a long time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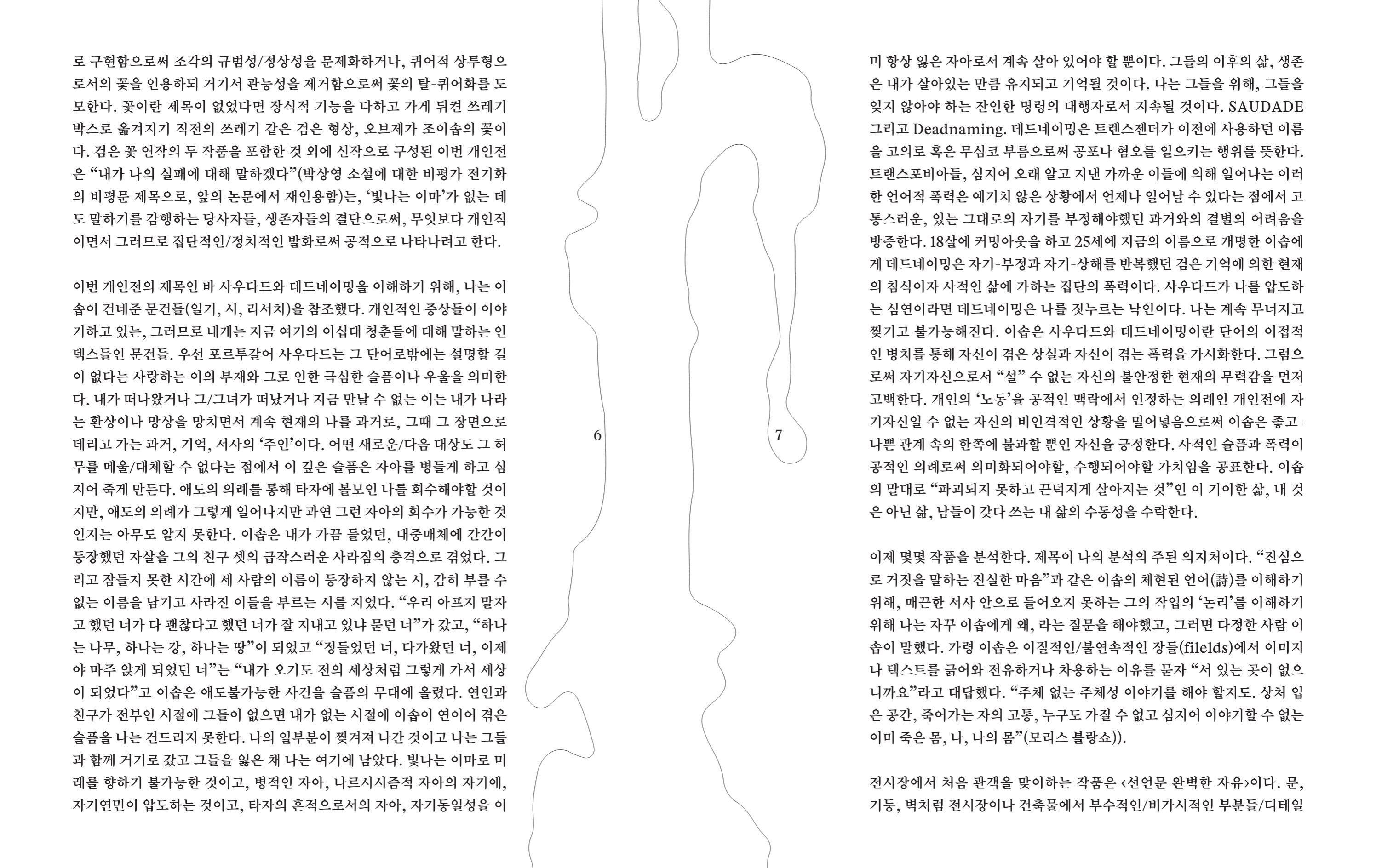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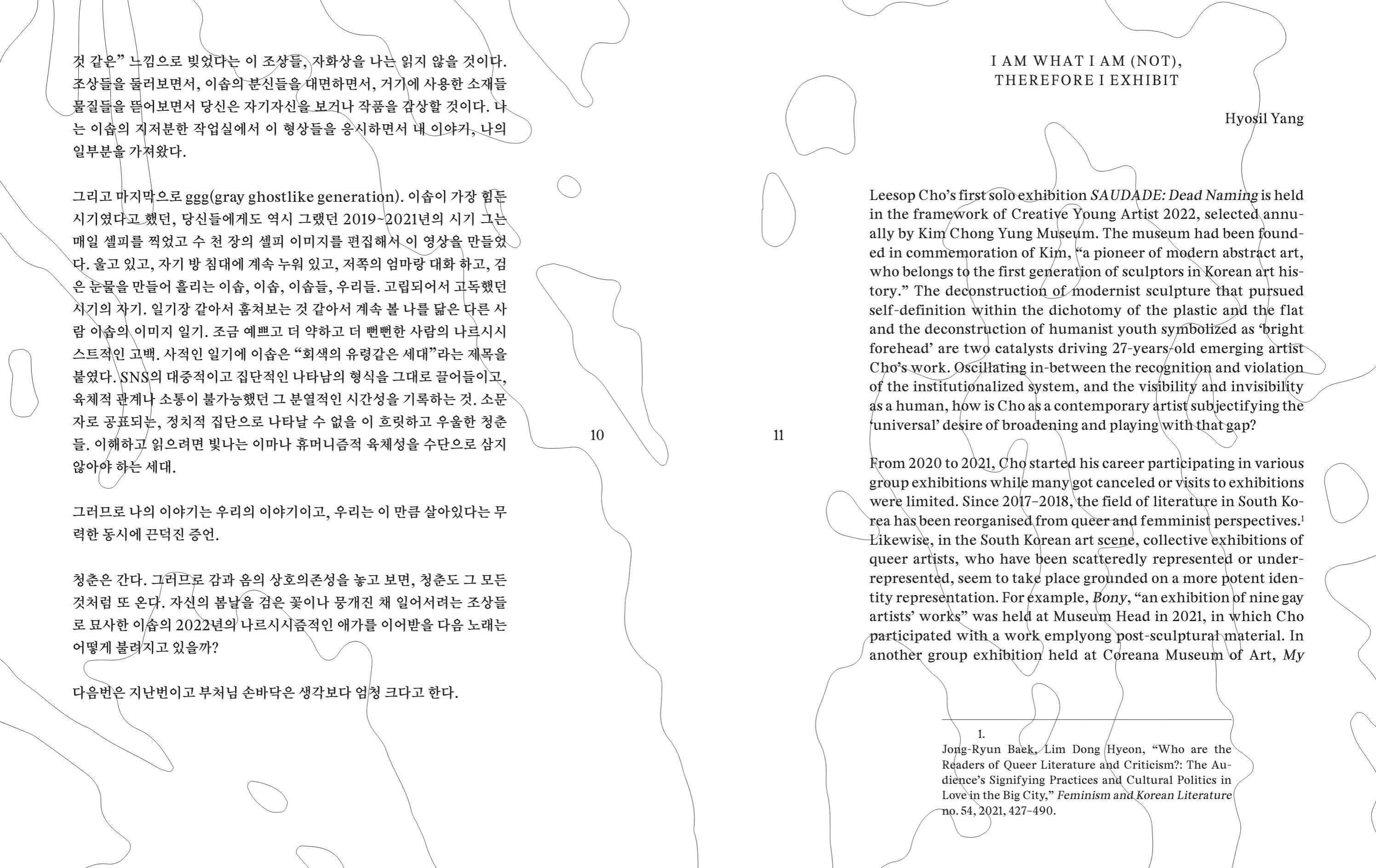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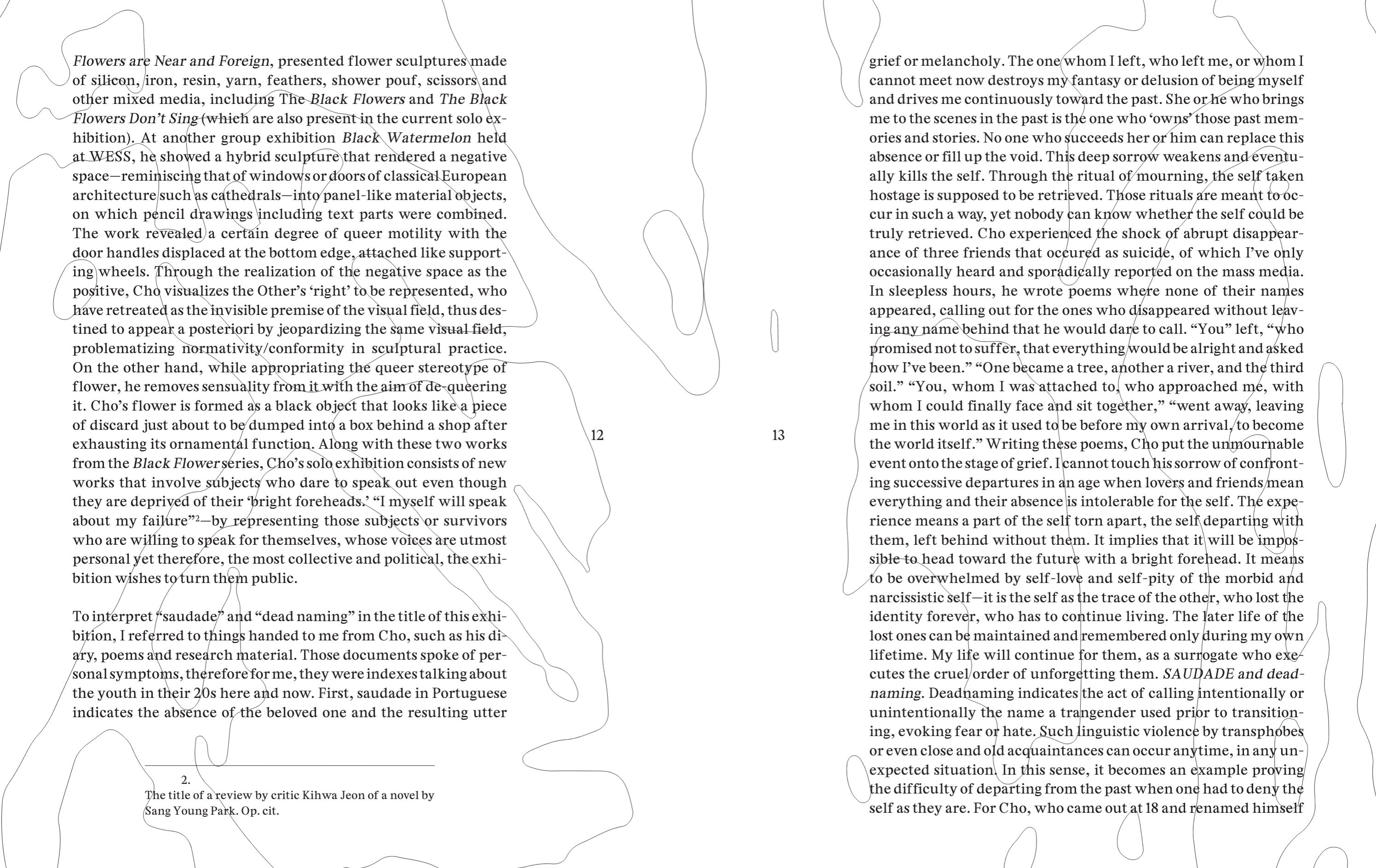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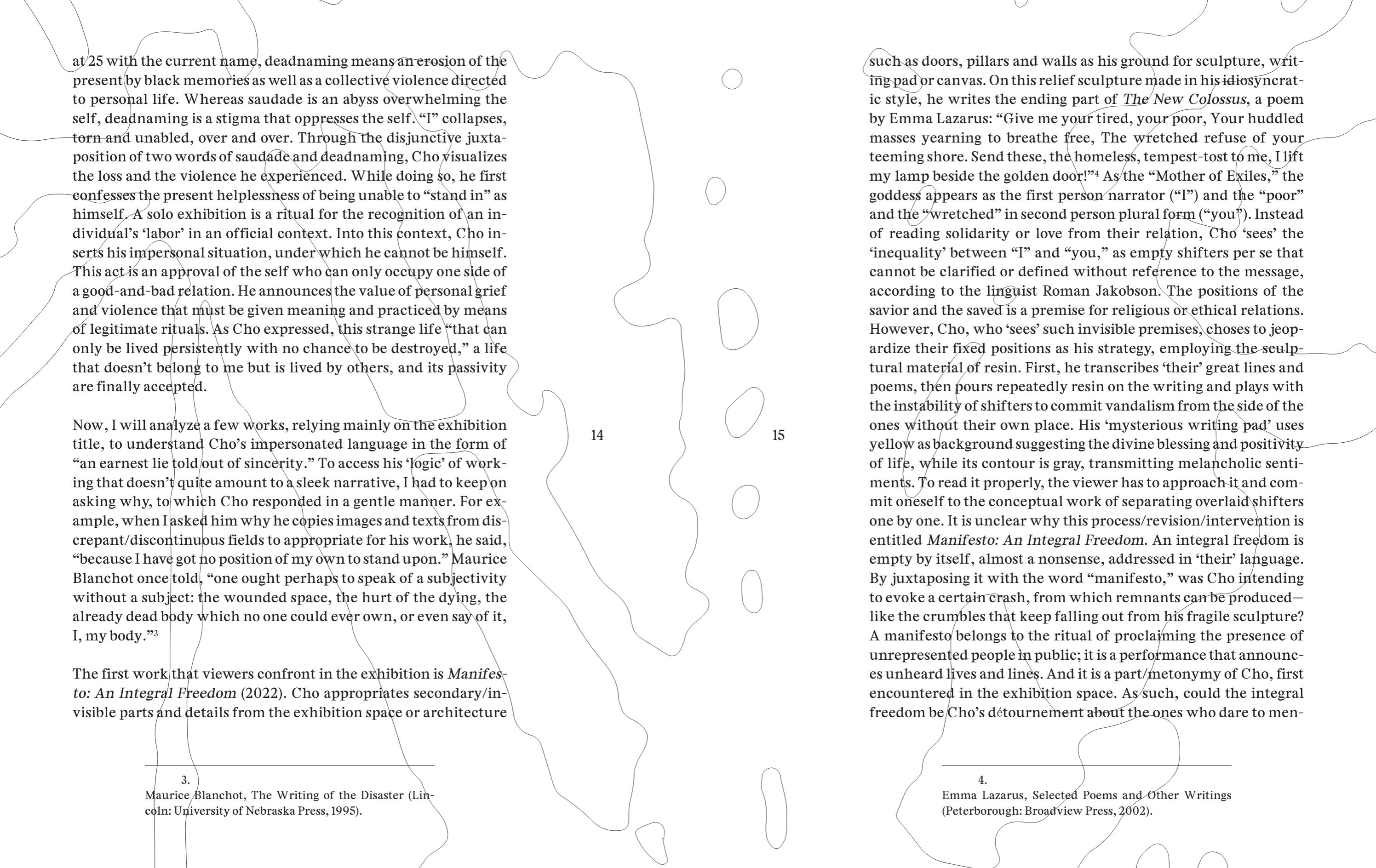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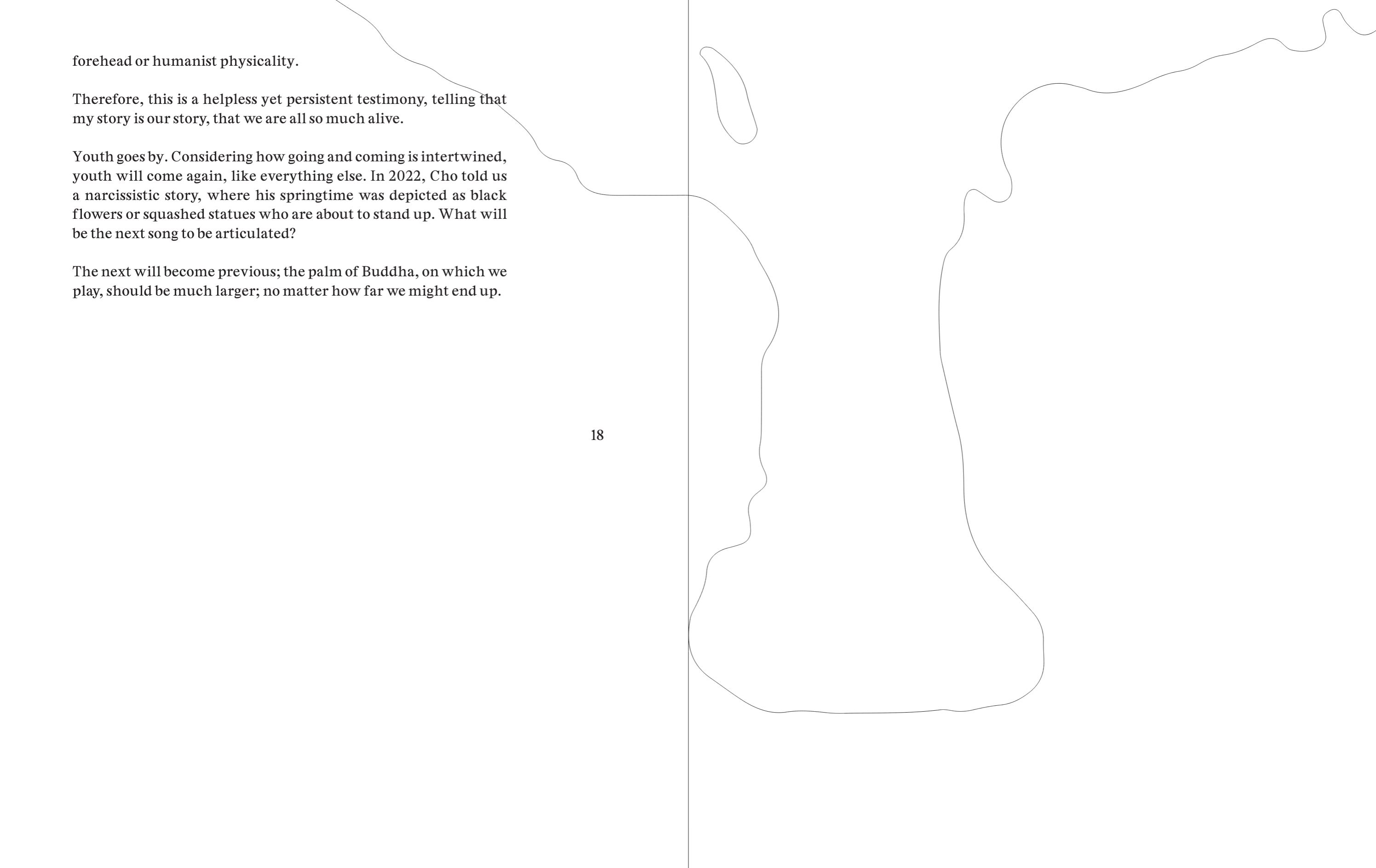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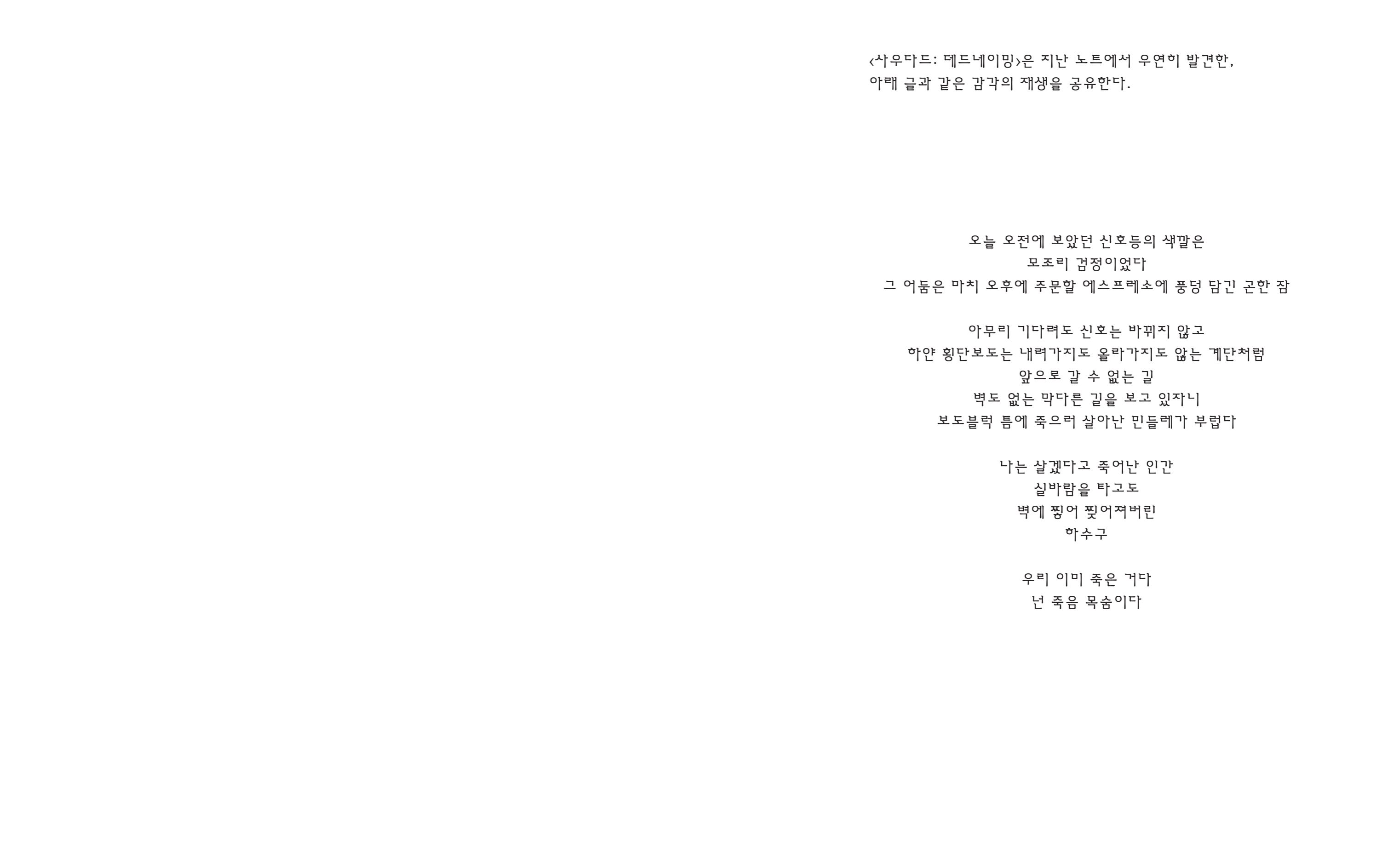
______
김해주, critic, 마이 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 (월간 미술 2023년 1월호 수록)
https://monthlyart.com/portfolio-item/마이셀리아-코어-레버카-손-폴-앤-스티브/
![]()
______
권시우, 「나와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를 위한 (청탁받지 않은) 글」 (2022)
https://lalan.art/journal/?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597952&t=board
일전의 칼럼에서 언급했듯, 다시 미술이라는 본론으로 돌아와보자. 나는 관객으로서 어떤 미술을 애호하는가? 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애호라는 표현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디깅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했고, 그로 인해 모든 취미들이 전문화되고 있으며, 미술 또한 그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만약 미술마저 취미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중이라면, 이는 단순히 팝 아트가 의도했던 대중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전유의 과정이 아니라, 미술을 둘러싼 (이론과 경험을 망라한) 온갖 지식들이 말 그대로 디깅되고, 이로써 각자의 지식 리스트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디깅은 취미를 매개로 모든 예술의 매체를 일상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현하면서, 한때 그저 소비자로 호명됐을 뿐인 불특정 다수를 취미라는 분과를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로 전환하기에 이른다.물론 이때의 전문가들은 어떤 공식 절차 같은 것은 과감하게 생략한 채, 단지 취미의 영역 내에서 서로 간에 유의미한 부분 집합을 형성했을 때, 서로를 은연 중에 전문가로 승인하거나, 상대의 '분과'를 디깅할 만한 (플레이) 리스트로 저장해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추어리즘은 단순히 세미 프로와 동의어가 아니라, 각자의 취미를 24/7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식의 리그에 가깝다. 즉 디깅에 기반한 취미는 어느새 유희의 감각을 초월했으며, 심지어 충분히 '흥미로운' 지식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가 아마추어라는 비공식적인 자격으로부터 박탈당하는 희한한 상황을 초래한다.
참고로 나는 스스로를 아마추어나 세미 프로로 공식화할 만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굳이 애호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애호의 관점은, 그것을 취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불특정 다수 속에서) 언제나 모호하게 만든다.
최근에 내가 애호했던 전시는, 본 글의 제목에서 예측할 수 있듯, 아무래도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였다. 김솔이, 박보마, 조이솝, 이하 세 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작업을 매개로 어떤 인물을 호명하지만, 정작 호명된 인물은 그에 충분히 화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애초에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는 개별적인 명사라기보다, 동사로서의 상태를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공간 전반을 말 그대로 잠식하기에 이른다. 즉 플로우 플랜을 통해 구획된 작업들의 영역과 별개로, 각기 다른 동사들은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침투하면서, 관객이 의미론적으로 식민화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 중이다. 후자는 그런 식으로 점차 확장되는 동사의 범주 속에서 '인물'을 희석시킴으로써, 애초에 의도했던 호명의 시도를 은밀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 거부의 뉘앙스다. 앞서 언급했듯, 전문적인 아마추어가 확보하고 있는 인물 사전에 가까운 (플레이) 리스트는 일종의 대안적인 지식 체계로 거듭 재편되고, 심지어 그것은 아카데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론'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대안적일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아마추어리즘에 미처 합류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를 이론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지가 부재한다. 즉 아마추어리즘은 취미의 과잉 소비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을 제명함으로써, 한때 아마추어들이 공유했던 유희의 감각이 일종의 스포츠로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거부의 뉘앙스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명된 개인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의도치 않게 퀴어성의 문제와 공명한다. 이를테면 퀴어적인 존재는 반드시 성적 정체성을 준거 삼아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필드'에서 배제된 개인들의 관점을 토대로 조형된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는 앞서 언급한 가상의 인물, 즉 퀴어적인 존재를 각기 다르게 체현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교차성의 영역을 조성한다. 혹은 그들은 교차 과정에서 성사된 '확장된 신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퀴어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의라는 개념 자체를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화한다. 이를테면 나와 같은 관객은 벽화로 구현된 박보마의 <레버카 손 삶의 4개의 장면과 그 외>로부터 즉각 어떤 '인물'을 도출해내는 대신, 무의식의 시퀀스에 가까운 다소 불확실한 도상들 사이에서 갈피를 잃는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작업은 명사가 규정하는 단일한 신체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바로 그 과정을 동사로서의 상태로 제시한다.
이는 '필드'에서의 규칙과 상관없는 분주함 속에서 스스로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우리의 섣부른 짐작과는 달리, 은폐의 과정은 역동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부마저 풍부한 뉘앙스로 표현한다. 거부의 뉘앙스는 불특정 다수를 미처 호명하지 않았거나, 애초에 그럴 만한 의사가 없는 '필드'에 급진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벽장 속으로 들어가게끔 독려한다. 그러나 벽장은 단순히 외부의 세계로부터 차단된 격리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최소한 나는 벽장의 세계를 유영하면서, 나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몽상에 빠져들었고, 때로는 그것을 일종의 유희로 가늠했으며, 그보다 자주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러한 경험은 사실상 퀴어성을 내밀하게 해제하는 과정으로써, 퀴어적인 존재가 인물 사전에 단순 명료하게 등재되는 상황을 거듭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다.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는 벽장의 세계, 혹은 그곳에서 갈수록 풍부해지는 뉘앙스를 포괄하려는 시도다. 그와 동시에 뉘앙스는 언어를 우회하거나, 교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작업들은 스스로를 은폐한 존재들이 '확장된 신체'라는 범주 속에서 현전하게끔 만든다. 실제로 조이솝은 폴에게 부과된 양가적인 성별을 논바이너리라는 공동의 의제로 심화하는 대신, 그저 젠더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뒤얽힌 상태를 조각으로 결정화한다. 비록 폴의 두상으로 대변되는 자아는 존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지만, 어찌됐든 조각의 물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처연하게 기념된다. 다른 한편, 60년대의 미국 대중문화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슬로건으로 기능했던 스티브는, 파이프 라인에 결박된 듯한 신체의 토르소에 빙의한 채, 퀴어 남성이 탐닉하는 '남성성'의 사도마조히즘적인 길항 관계를 스스로 은유하고 있다.
결국 폴 앤 스티브는 각자가 의도치 않게 체화한 젠더 의식의 기저에서 요동치는 섹슈얼리티가 간신히 억제돼 있는 상태로부터 (조각적인) 은유의 수사들을 도출해내고, 오로지 그것들을 통해서만 어렴풋하게 현전한다는 점에서 서로 매개된다. 반면 김솔이의 <마이셀리아 코어>는 매개의 수순을 생략한 채, 곧바로 동명의 인물을 일종의 유기체적인 환상 속에서 말 그대로 녹여낸다. 소위 '이미지 기립 조각'이라고 명명된 일련의 작업들은 실제로 녹인 우레탄을 재료로 삼고 있으며, 그것이 퇴적되는 양상에 따라, 작가가 상정하고 있던 인물의 모양새는 이미지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얼핏 퀴어성이라는 다소 막연한 도안을 토대로 퀴어적인 존재를 조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수들, 혹은 그러한 변수들을 매개로 번식하는 퀴어적인 존재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마이셀리아 코어는 균사체의 구조를 뜻하며, 그러므로 '인물'로서 미처 기립하지 못한 이미지는 바닥에 고인 채로 방치되거나, 다수의 파편들로 공간 상에 산개한다. 어쩌면 '인물'의 단일한 형상은, 사실 그런 식으로 방치되거나, 산개하는 무의미의 존재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본 전시는 뒤늦게나마 결정화된 신체의 표본들과 다소 섣부르게 용해된 신체 사이의 스펙트럼을 조율하는 감각을 뉘앙스라고 암시한다. 뉘앙스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집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계속 불발될 수 밖에 없다. 즉 뉘앙스는 애초에 '필드'에 의해 호명된 인물들의 군집이 아니며, 무엇보다 그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퀴어성은 인물 사전에 등재되기를 거부하는 와중에 조성된 뉘앙스 자체이며, 그것을 발단 삼아 다양한 신체를 매개로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는 모두 퀴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은폐란, 단순히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체로서 현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숙고의 과정이다.
그런 식으로 벽장의 세계는 점차 역전된 가시성을 획득한다. 비록 그곳은 화려한 글리치로 표상될 수 없을 만큼 내밀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클로짓과 디나이얼의 관점에서 퀴어성을 상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여지를 제공한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미처 발화되지 못한 채로 머뭇거리는 언어들은 뉘앙스의 풍부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뉘앙스는 그 자체로 역동적이다. 뒤늦게나마 글의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을 재고하자면, 나는 뉘앙스를 구현하는 미술을 애호한다.
왜냐하면 내가 퀴어적인 존재로서 뉘앙스에 가담하고 있고, 사실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으로써 끝내 부서지는 말들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언표하거나, 그에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다소 부산스런 과정이다. 나는 그러한 과정 또한 애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호는 뉘앙스를 (관객으로서) 포용하는 방식이다.
______
이연숙(리타), Mycelia Core, Rebercca Son, Paul & Steve 를 위한 글
![]()
![]()
______
남웅, Bony 리플렛 비평 중 일부 (2021)
![]()
(...)
______
3040 한국 조각가 57인 - (2) 혼성 조각, 장르의 경계를 넘어 (아트인컬처 2021년 9월호에 수록)
https://www.theartro.kr/kor/features/features_view.asp?idx=4517&b_code=31e
현대조각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입체 조형’의 시대가 개막했다. 조각은 예술작품의 존립 근거를 ‘선택’으로 확장한 레디메이드, 일상용품을 ‘집적’하는 아상블라주의 영향으로 산업 물질을 재료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던 좌대마저 사라지면서 조각이 놓인 공간이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로 회화와 조각 대신 평면과 입체라는 장르 개념이 도입되면서 설치미술이 급속하게 확산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오브제, 키네틱아트, 퍼포먼스, 대지미술, 비디오아트 등이 조각과 ‘3차원성’을 공유하면서 장르의 경계가 완전히 해체된 듯 보였다. 조각에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조각가들은 ‘조각적인 조형성’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타장르와의 이종 교배를 시도했다. 확장된 표현의 물살을 타고 적극적으로 ‘혼성’ 양식을 배출했다. 이로써 동시대조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어디까지가 조각인가? 이창원은 구조물을 회화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주는 ‘회화조각’, 권오상은 3차원 입체를 2차원의 사진으로 구현하는 ‘사진조각’, 금민정은 목조각에 모니터를 조형 요소로 넣는 ‘영상조각’을 제작한다. 조각의 ‘입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시도다. 전소정, 김상진은 영상, 설치, 조각, 건축 등을 넘나들며 사회적인 주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다. 심승욱, 권용주는 값싼 폐품으로 거대한 설치조각을 구축해 동시대의 풍경을 스펙터클하게 펼친다. 연기백은 버려진 벽지로 ‘건축적 조각’을 구현하고, 한광우는 공간의 ‘스케일’을 소재 삼아 전시장을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정소영과 조혜진은 연구자의 태도로 대상을 분석해 이를 조각작업으로 치환한다. 기이한 식물을 조형하는 조이솝, 인테리어 소품의 제작 방식을 차용하는 이소정은 동시대의 세련된 ‘쇼룸’ 감각을 시각화한다. 곽이브와 김동희는 건물에 대응하는 입체이자 평면, 좌대이자 조각을 만들어 관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조각 경험을 제안한다.(...)
조이솝 조이솝은 ‘허공’에 대응하는 빼빼한 조각을 제작한다. 천장에서 아래로 흐르거나, 벽에 기생하는 조각은 부피감 있는 전통조각에 대한 조형적 반발. 흐드러지게 뻗은 ‘식물 조각’은 락다운 시대의 집단 취향으로 자리잡은 플랜테리어 트렌드를 겨냥하는 것일까, 고독과 결핍의 조형적 표징일까?
______
김무영, 민혜인, 조이솝, I told you I was no good. Bitch, are you sure to make me cry? 서문 (2021)
![]()
이연숙(리타), <친화적 전회, 그리고 나머지들> (2020)
![]()
![]()
![]()
![]()
![]()
![]()
![]()
______
Abhijan Toto, <FOUR FOLDS OF PAPER, OR NOTES ON GAZE> (2020)
![]()
![]()
![]()
![]()
![]()
![]()
______
고대영, Gaze 서문 (2020)